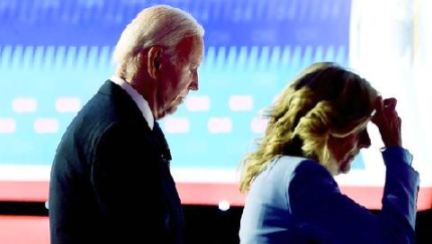2009년 로스쿨 개원을 전후해 많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실무교수로 임용됐다. 하지만 ‘후학양성’의 꿈을 안고 거액의 연봉을 마다한 채 학교로 간 이들 중 일부는 현실의 벽을 확인하고 다시 변호사로 복귀했다. 그들은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일까.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부터 경북대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중탁 교수는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바로 변호사 자격을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며 “로스쿨 졸업 후 사법연수원에서 1년가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률서비스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커리큘럼 문제도 지적됐다. 원광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학웅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이론적 바탕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 소송법을 가르치는 것은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뛰는 법을 가르치는 격”이라며 “일어서고 걷게 해주는 단계별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하대 로스쿨 실무교수로 2년간 재직하다 2010년 퇴직한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직접 소송을 할 수 없다 보니 로스쿨 학생들에게 공익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주려고 해도 외부 로펌 변호사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며 “실무를 하지 않으면 현직 때 맺었던 관계가 끊어지면서 학생들의 인턴 기회를 알선해 주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실무교수들이 변호사로서 법정에 설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 1년에 몇 건 정도로 제한해 교육 목적의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교수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로스쿨 실무교수로 있다 지난해 복귀한 조모 변호사는 “낮은 보수에도 사명감을 갖고 일하려 했지만 기존 법대 교수들이 실무교수를 견제하기 위해 강의 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교수 평가를 할 때 이론교수처럼 학술지 논문 등재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 평생 논문을 써온 학자들과 실무가들은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전영선·박민제·김기환·노진호·이유정 기자, 신중후·박은서 대학생 인턴기자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