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6회 지방선거의 날이다. 1995년 1회 선거가 실시된 이래 지방선거는 중앙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왔다. 지방의 행정서비스는 주민이 의사결정자들을 자기 손으로 뽑으면서 관치에서 민치로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 지방자치는 어느 새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됐다. 지방자치가 한국인이 잘 지키고 가꿔나가야 할 소중한 생활문화로 성장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가꾸는 핵심적인 요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다. 공동체는 어느 알 수 없는 곳에서 툭 떨어져 우리 앞에 주어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다. 구성원으로서 국민, 혹은 시민 개개인이 참여해 구체적인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투표 참여는 공동체에 대한 애정 표시이며 공동체의 정당성을 높이는 고귀한 선택이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1995년만 해도 68.4%를 기록했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엔 48.9%로 떨어져 지방자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2006년엔 51.6%, 턱걸이로 과반 투표율을 보이더니 2010년에 54.5%로 상승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이틀간의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이미 11.5%가 확보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관위는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정치권이나 지역공동체를 향한 의사표시다. 이 선택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여론조사와 다르다.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7장의 투표지를 손에 쥐게 될 유권자는 정당·후보·정책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세월호 참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대 정당은 ‘세월호 심판론’(새정치민주연합)과 ‘박근혜 지키기’(새누리당)를 슬로건으로 걸었다. 지방선거치곤 중앙정치의 개입이 노골적인데 전국 선거의 성격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다만 유권자가 정당 기준을 따르더라도 7장 모두를 특정 진영의 기호 하나만으로 줄투표하는 건 곤란하다.
후보의 면면을 따지는 걸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17명의 특별·광역시장,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789명의 특별·광역시의원, 2898명의 기초의원, 17명의 교육감 등 무려 3952명을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전 무대다. 이들이 한 해 집행하는 예산만 해도 150조원, 4년간 600조원이다. 사람 됨됨이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들의 전과·납세·병역·재산·경력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는 선거 공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특히 파렴치 전과 경력자, 납세액이 없거나 지나치게 낮은 후보들은 정당 선호와 관계없이 걸러내는 게 좋겠다. 특히 예산집행 책임자인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선택할 때 후보 기준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가 개인적으로 중시하는 특정 정책을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 9000억원이 비용으로 들어간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는 오로지 유권자의 투표 참여와 합리적 선택에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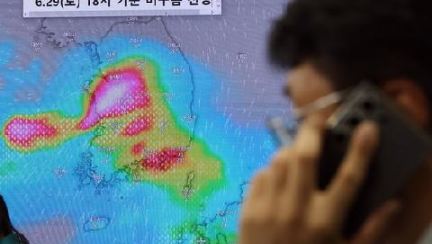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