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 격언에 “위기상황 속 최고의 배는 리더십(leadership)”이란 말이 있다. 바다 한가운데서 고립된 채 표류하는 배(ship)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배는 실제 선박일 수도 있고, 각자 몸담고 있는 조직일 수도 있으며, 대한민국호(號)를 지칭할 수도 있다.
세월호 참사는 ‘리더십의 부재’라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 약점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그것도 현장부터 컨트롤타워까지 모든 단계에서 리더십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줬다. 선장은 배를 버리고 탈출했고, 해경은 침몰하는 세월호를 앞에 두고도 선뜻 구출에 나서지 않았으며, 본부의 책임자들은 우왕좌왕하다 아까운 골든타임만 허비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럴 해저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국가를 배에 비유한 대표적 사상가는 절대군주제를 옹호했던 프랑스 사상가 장 보댕이다. 그는 “국가라는 배는 가족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 즉 군주에 의해 항해되는 게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루이 14세가 ‘계몽군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론적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런 논리가 19세기 근대 산업사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었다. “문명국가에서는 아무리 좋은 전제정치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유해하다”는 존 스튜어트 밀의 비판은 이후 서구 사회가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데 나침반 역할을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이런 리더십이 정착돼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 참사는 불행히도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적 관료주의’ 폐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정부든, 기업이든 윗선의 지시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이 일상화됐다. 부하에겐 냉혹하면서도 상관에겐 오로지 충성하는 모습도 흔하다.
이런 경직되고 뒤틀린 조직 문화가 화를 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게다. 오죽하면 군대에서도 “무능하고 멍청한 지휘관은 눈앞의 적군보다 무섭다”는 말이 회자되겠는가.
더불어 같이 가는 민주적 리더십은 외면한 채 이윤과 효율만 강조하고, 마피아처럼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데 혈안이 된 리더들 탓에 21세기 대한민국호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70여 년 전 마하트마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건만 우리는 여태껏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온 셈이다.
이제 6·4 지방선거가 17일 남았다. 선거 때만 국민 앞에 머리 숙이는 리더, 당선된 뒤에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리더, 지위를 이용해 자기 안위만 챙기는 리더는 냉정하게 골라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리더, 조금 늦더라도 국민과 함께 가려는 리더를 심사숙고해 뽑아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희생자들의 명목(暝目)을 비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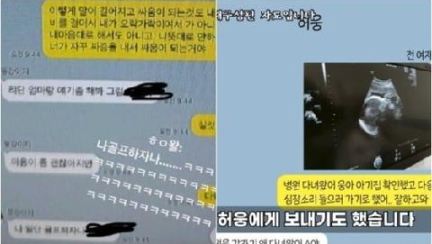
![[단독]경찰 "역주행 운전자, 브레이크 안 밟은 듯…이후 정상 작동"](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ea364928-199e-4356-939f-67c767be2c61.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