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 탈세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 중인 가운데 재계 서열 26위의 효성이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특히 효성그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11일 효성그룹 본사와 조석래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조 회장과 세 아들을 출국 금지했다. 이어 이번 주부터는 핵심 임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효성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로 발생한 해외사업 부문의 대규모 적자를 숨긴 뒤 10년에 걸쳐 메꾸는 방식으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혐의가 국세청 조사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만큼 검찰 수사는 조 회장 일가의 배임·횡령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효성의 해외거래 내역을 요청하는 등 해외비자금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효성 수사가 재탕이라는 데 있다. 검찰은 앞서 2008년 9월부터 1년 넘게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했다. 조 회장까지 소환 조사했지만 임원 2명을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사돈 기업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처럼 같은 사건을 두 번 수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지 자성하고,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총수도 불법에 대한 형사책임을 비켜갈 수 없음은 최근 재판과 수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수사만큼은 오직 사실만 따라가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게 고려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같은 차원에서 ‘전(前) 정부 손보기’라는 시각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법률과 사실에 따라 오너 일가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엄정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엔 약하고 죽은 권력엔 강하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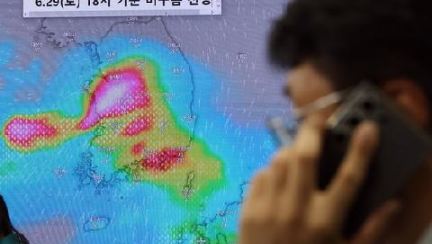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