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회사원 이모(43)씨는 서울의 A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난 후 이상증세를 느꼈다. 몸이 떨리고 열이 났다. 병원에선 “검사 과정엔 별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이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다. 이곳에선 “이전 병원에서 내시경 시술 중 직장 부근에 천공(구멍)이 뚫렸고, 고름이 생긴 상태(농양)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씨는 A병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냈다. 과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2주 뒤에 이씨에겐 ‘조정 신청서’가 덩그러니 되돌아왔다. A병원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2주 동안 헛심만 썼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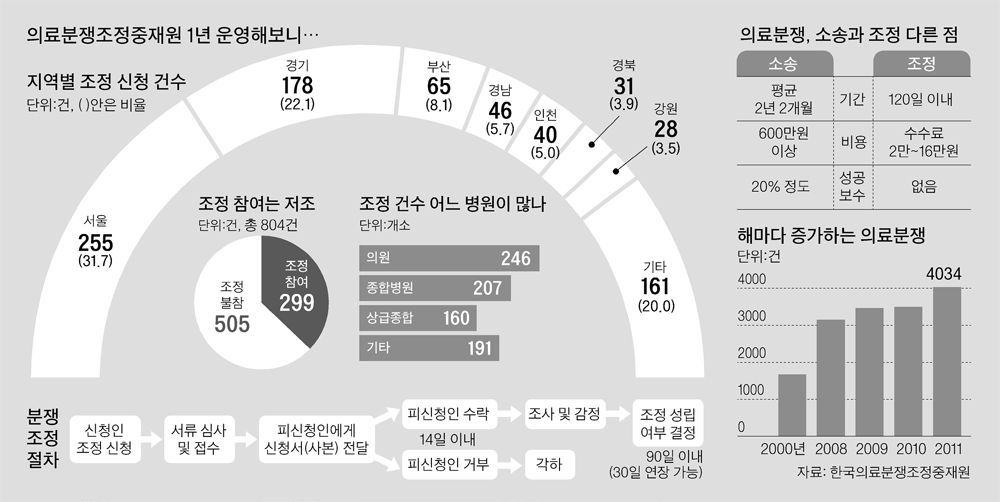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7일로 출범 1년을 맞았지만 기대한 만큼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5일 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804건이지만 실제 조정이 시작된 것은 299건이었다. 전체의 39% 수준이다. 이 중 162건(20%)이 합의되거나 조정 결정이 났다. 올 1분기에는 301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의료분쟁은 233건이다. 건수는 중재원보다 다소 적지만 전년 동기(73건)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의료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재원을 만들었지만 실제론 두 기관으로 조정 신청이 양분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는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은 의료분쟁이 접수되면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중재원도 이런 한계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많은 환자들은 조정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것에 상당한 불만을 갖게 된다. 항의전화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유선경 홍보팀장은 “‘차라리 그냥 문을 닫아라’거나 ‘청와대에 직접 건의하는 게 낫겠다’는 항의 전화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일단 조정위원의 인적 구성이 전문성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현재 조정위원은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료인 2인과 비의료인 3인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간호사까지 참여 가능한 2명의 의료인만으로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의료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조정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1988년 국회에서 의료조정중재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23년 만이다. 의료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평균 2년2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데다 평균 6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환자나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반면 중재원은 어느 한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더 이득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실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불만을 토로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상황이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중재원 주최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열렸다. 전북대 김민중(법학) 교수는 “원칙적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사유를 미리 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의료인)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조정 절차 시작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