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기업의 현금성 자산 규모라며 제시한 52조원은 언뜻 보기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 돈만 투자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착시가 생길 정도다. 박 대통령도 “(현금성 자산의) 10%만 투자해도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세출 확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금성 자산=투자하지 않고 쌓아둔 자금’이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 발언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오해’라고 손사래를 친다. 52조원의 정체는 2011년 3분기 말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12월 결산 법인 기준)의 현금성 자산 총액이다.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56조원에 육박한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현금으로 바로 교환이 가능한 물건, 만기 1년 미만의 예금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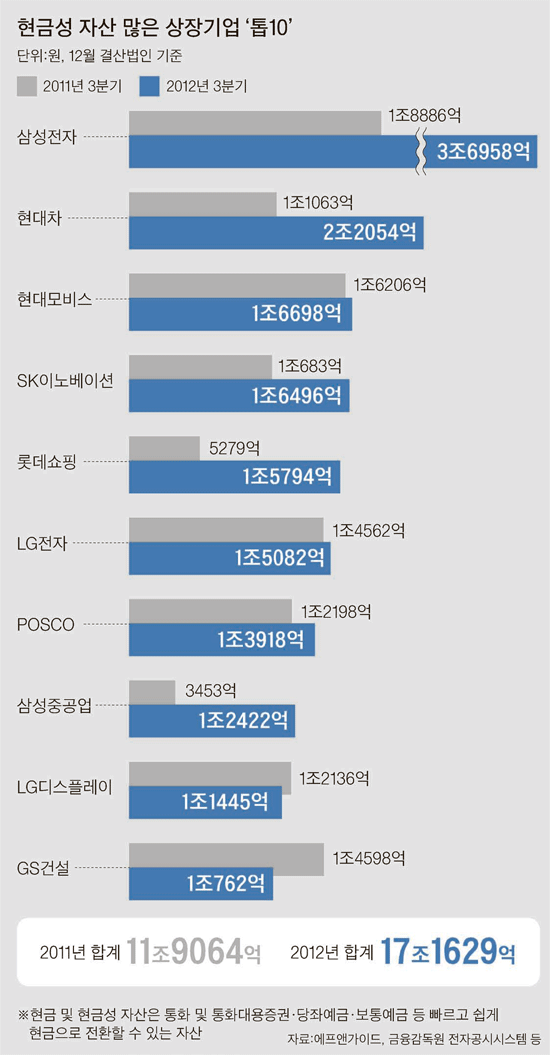
그러나 현금성 자산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미래 위험에 대비해 비상금을 쌓기도 하고, 인수합병(M&A)을 위한 자금을 축적하기도 한다”며 “현금성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 돈’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예비 자금”이라고 말했다.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1370억 달러(약 153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면 당장 삼성전자 주식 68%를 살 수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 현금성 자산이 ‘노는 돈’이라면 애플은 힘들여 경쟁할 필요 없이 당장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인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금성 자산 중 일부 여윳돈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도 어렵다. 지난 4일 30대 그룹은 올해 148조8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7%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춘 가운데, 기업은 오히려 투자 목표를 높인 것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현 시점에 할 수 있는 만큼 투자를 모조리 긁어낸 수치”라며 “대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한 부분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약 3조6958억원), 현대차(약 2조2054억원) 등을 제외한 상당수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조원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액면으로는 커 보이지만 각 기업의 전체 자산 대비 비율로 따지면 1~2% 수준인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추가 투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오늘의 운세] 7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