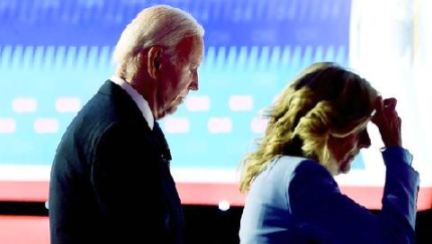천안함이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한 지 3년이 흘렀다. 천안함 폭침은 우리 정부의 대북 위기관리에 허점을 보여줬다. 이런 허술함은 8개월 후에 벌어진 연평도 피격 때도 재연됐다. 위기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방송사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혼선을 빚었던 안보시스템과 대북정책을 재조명하는 시리즈를 3회 게재한다.
이명박(MB) 정부는 출범 직후 전임 노무현 정부가 운영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정상황실을 폐지했다. 이전 정부의 국정 색채를 벗기는 차원에서 그랬다고 한다. 2008년 3월 말쯤 ‘위기정보 상황팀’을 급조해 이를 대체했다. 이 팀의 핵심간부였던 K씨는 “당시 청와대는 ‘위기관리’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심지어는 왜 이런 부서를 둬 ‘없는 위기를 들먹이느냐’는 시선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방부나 국정원 등에서 청와대로 들어오는 북한 관련 정보들은 윗선에 단순히 ‘전달’될 뿐이지 분석, 종합관리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은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인상이었다. 신언상 전 통일부 차관은 “남한은 ‘성공한 갑(甲)’, 북한은 ‘부도위기의 을(乙)’로 보는 이 대통령의 남북관계 인식이 읽히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청와대 고위직이었던 한 인사도 “대통령은 남북관계 는 절로 돌아가는 분야로 보고, 4대 강, 원자로 수출 등 국부(國富)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역량을 기울이는 통치철학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예상과는 달리 임기 내내 북한발 위기상황이 조성됐고,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에서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오전 11시5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으나, 관련 수석비서관은 이를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1시간30분가량 늦게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날 오후 1시 위기정보상황팀이 비서관 모두에게 ‘박씨 피살’ 사건 개요를 문자로 보냈으나, 이 사건을 보고받은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가기 전에는 어떤 당국자도 나서지 않았다.
천안함 폭침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합참으로부터 “초계함 바닥에 파공이 생겨 물이 새고 있다”는 엉뚱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미 천안함은 반토막이 나 가라앉은 후였다. 2010년 11월 연평도 피격 사태 때는 ‘확전자제’라는 대통령의 일성(一聲)이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에 전달됐다. 2009년 추진된 남북 정상회담은 임태희 당시 대통령 특사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갈등으로 무산됐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참모들의 이견을 조정하고 결심을 내리지 못한 것은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비전과 철학이 없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안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관계기사]
▶ "VIP 쉬신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늑장 보고
▶ 靑 검색대 선 北김기남, "핸드폰 올려놓으라"하자…
▶ 천안함 폭침 때, 합참 간부들 자리에 없었다


![50마리 구조해 절반 죽었다…'개농장 급습' 라이브 방송 실상 [두 얼굴의 동물구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30/0e5e5af3-4691-482d-a87f-a730a3b763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