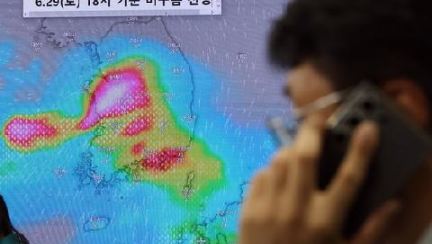요르단 자타리의 시리아 난민 캠프 생활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지만 맑게 웃는 어린이들의 표정은 환했다. 자타리 캠프엔 난민 12만 명이 머물고 있다. [자타리(요르단)=정종훈 기자]
요르단 자타리의 시리아 난민 캠프 생활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지만 맑게 웃는 어린이들의 표정은 환했다. 자타리 캠프엔 난민 12만 명이 머물고 있다. [자타리(요르단)=정종훈 기자]시리아 국경에서 15㎞ 떨어진 요르단 자타리. 메마른 사막에 지어진 요르단 내 유일한 시리아 난민 캠프다. 캠프에 거주하는 12세 소년 사르드의 거친 손에서 황량한 땅과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보낸 시간이 느껴졌다. “앗신(중국)?” “꾸리아 자누비아(남한)!” 찌푸렸던 얼굴은 한국이라는 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펴졌다. 대뜸 출신국가를 먼저 묻는 대화에선 어느덧 강대국들의 세력 경쟁 장소가 돼버린 시리아의 상흔이 그대로 전달됐다. 난민들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시리아 정부와 가까운 국가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2011년 3월 15일 남부 다라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 시리아 국내에서 7만여 명이 죽어가는 사이 유엔은 국외로 나간 난민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6일 발표했다. 시민군을 지원하는 미국·영국 등과 정부 측을 돕는 러시아·중국 간의 기싸움, 수니파와 시아파의 반목이 뒤섞인 내전은 국경 너머 자타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텐트와 캐러밴(컨테이너형 주거 건물)이 혼재된 자타리 캠프 내에는 시리아 국기와 자유시리아군(시민군) 깃발이 동시에 휘날렸다. 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니세프 등 공식 사무실에는 별이 두 개 박힌 시리아 국기가, 주거지 사이에는 세 개의 별이 그려진 자유시리아기가 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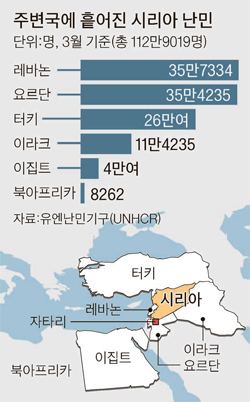
내전은 수니-시아파 간 감정의 골도 깊게 만들었다. 어느덧 한쪽이 이길 경우 나머지는 살아남기 힘든 ‘제로섬 게임’이 됐다. 수니파 국가인 요르단으로 들어온 난민들의 절대 다수 역시 수니파다. 시리아는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12%)가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보 기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 1970년 집권한 하페즈 알아사드 대통령부터 시작된 시아파 독재에 불만이 쌓인 수니파(74%)는 대부분 시민군이나 난민이 됐다. 수니파 난민들은 인접국인 레바논과 요르단·터키·이라크 등으로 몰렸다. 하지만 터키가 난민 추가 수용에 난색을 표한 데다 이라크와 레바논이 시아파 국가라는 점에서 향후 신변의 위협을 우려해 요르단으로 몰리는 추세다.
요르단의 고민도 따라 커지고 있다. 1월 6만 명 수준이었던 자타리 캠프의 난민은 두 달 새 12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자타리는 어느덧 요르단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 규모가 됐다. 식량과 물, 텐트 등 생필품은 늘 부족한 상태다. 그런데도 하루 수천 명의 난민이 캠프로 몰려들어오고 있다. 가끔 소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유니스(13)는 “친구들이 있는 시리아로 돌아가고 싶다”고 울먹였다. 하지만 대부분 난민들은 내전이 끝나 돌아갈 날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걸 안다.
비공식적으로 45만 명의 난민이 유입된 요르단의 여론은 아직 호의적이다. 하지만 최근 서민층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시리아 난민들이 뺏어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언론들도 난민 수 제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측에서도 시리아 난민 유입이 장기화될 경우 관광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정종훈 기자
![美대선 첫 토론 끝나자마자…'바이든 후보 교체론' 터져나왔다 [미 대선 첫 TV토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2d3c4b71-8167-498f-bf6b-64eba3f58689.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